1910년대 연해주 독립군 두문자 : 성 권 군 의
성 : 성명회(1910)
권 : 권업회(1911)
군 : 대한광복군 정부(1914)
의 : 대한국민의회(1919.3)
1. 성명회(1910)
성명회라 함은 1910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되었던 독립 운동 단체를 말한다. 성명회(聲鳴會)라고도 한다. 1910년 8월로 접어들면서 한국을 강점, 병합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더욱 명확해지자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 지방의 애국 동포들은 한인학교에서 한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한국병합을 저지하기 위한 항쟁기관으로 이상설 등이 주동이 된 성명회를 결성하고 취지서를 발표하면서 궐기하였다.
설립목적은 “대한의 국민 된 사람은 대한의 광복을 죽기로 맹세하고 성취한다.”는 것이었다. 유인석 · 이범윤 · 김학만(金學萬) · 차석보 · 김좌두(金左斗) · 김치보 등 6인의 명의로 된 취지서는 이른바 한일 합방의 부당성을 각국 정부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8월 23일 하오 4시 블라디보스토크의 『다리요카야 우크라이나』 신문을 통해 합병 확정의 비보를 전해들은 한인동포들은 즉시 한인학교에 회합하였다. 비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회의의 결의에 따라 성명회의 이름으로 “유혈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병을 저지한다.” 는 격렬하고도 비통한 격문 1,000매를 인쇄하여 러시아와 만주 각지의 애국 동포들에게 배포하고 결사 항쟁을 호소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에는 ‘국제 공약에의 배신’을 나무라는 공한을 보내고 각국 정부에는 합병 무효를 선언하는 전문과 성명회의 선언서(이상설이 선언서를 기초하였고, 성명회 대표로 추대된 유인석이 보완하여 완성하였으며, 유인석 · 이상설 등 총 8,624명의 독립운동지사들의 서명이 첨부되었음)를 보내기로 하였다. 각국 정부에 보낸 전문 내용은 ‘대한일반인민총대 유인석(大韓一般人民總代 柳麟錫)’ 명의의 한문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청국 정부에는 그대로 보냈으나 기타 열강에는 프랑스어와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발송하였다.
그날 밤 50여 명의 성명회 청년들은 결사대를 조직하여 일본인과 거류지를 습격하기 시작하였다. 8월 25일에는 부녀자까지 가담하는 등 결사대 인원이 1천여 명으로 증가되었다. 이어 26일에는 주요 인물 50여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북쪽 인근에 있는 ‘친고재’에서 모임을 가지고 일본 영사관의 관할을 결사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이범윤은 ‘두만강의 결빙기를 기다려 의병을 200명 단위의 부대로 편성, 북한 지역으로 진입시켜 총 병력 1만 명에 달하면 독립 전쟁을 전개한다.’는 제의를 의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회는 취지서 및 선언서와 각 종 격문을 인쇄 · 반포함으로써 간도는 물론 시베리아 지방의 한인에게까지 활동을 더욱 확대시켜갔다. 그러나 9월 11일을 기하여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항의 제기와 주동 인사들의 체포, 인도를 요구하자, 러시아당국은 이상설 · 이범윤 등 성명회와 모체라 할 수 있는 13도의군의 간부 20여 명을 체포, 수감하고 한인의 모든 정치활동을 엄금하였다. 그 결과 더 이상의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해체되고 말았다.
2. 권업회(1911)
권업회라 함은 1911년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조직된 한인 자치 단체이자 독립운동 단체를 말한다. 권업회는 국권 상실 이후 연해주 한인 사회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새롭게 결성한 한인 자치 결사였다. 1911년 5월 19일 김익용(金翼瑢), 강택희(姜宅熙) 등을 중심으로 권업회 창립 발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음 날 58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권업회를 창립하였다. 초대 회장에는 최재형(崔才亨), 부회장에는 홍범도(洪範圖)가 선임되었다. 권업회는 대외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의 공인을 받았다. 이후 1911년 12월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권업회는 연해주 한인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독립운동을 추진하여 조국 독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업회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권업회는 산하에 신문부를 설치하고 기관지 〈권업신문(勸業新聞)〉을 간행했다. 당시 〈권업신문〉에는 주필 겸 신문부장이었던 신채호(申采浩)를 비롯하여 장지연(張志淵), 정순만(鄭淳萬), 이강(李剛) 등 저명한 항일 운동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연해주 각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후진 양성을 도모하였다. 한편 권업회는 실업부와 구제부를 두고 연해주 지역 한인들의 경제 활동을 권장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인 농민들을 이주시켜 새로운 개척지를 만들었으며, 거주권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한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활동을 병행하였다.
권업회는 연해주 지역에서 한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지만,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일제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 당국에 의해 1914년 8월 강제 해산되었다.
3. 대한광복군 정부(1914)

대한광복군 정부라 함은 1914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워졌던 망명 정부를 말한다. 1911년 항일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권업회(勸業會)가 광복군을 양성하기 위해 1913년대전학교(大甸學校)라는 사관학교를 설립, 운영하였다.
러시아의 극동총독과 교섭하여 광복군 군영지(軍營地)를 조차하는 한편, 광복군 양성을 위한 비밀결사인 양군호(養軍號)와 해도호(海島號)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1914년 권업회 의사부 신임의장 이상설(李相卨)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시베리아 전역에 훈련받은 무장 병력 약 3만여 명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914년은 러일전쟁 10주년이 되는 해로, 러시아에서는 러일전쟁의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개전설이 나돌았다. 이에 발 맞추어 권업회는 시베리아와 만주, 미주에 널리 퍼져 있는 무장력을 갖춘 각 독립운동 단체를 모아 독립전쟁을 구현할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또한 이 해는 우리나라 사람이 시베리아에 이민온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여, 이를 크게 기념하기 위한 기념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많은 군자금을 모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정부 수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부 수립은 권업회 중심 회원인 이상설·이동휘(李東輝)·이종호(李鍾浩)·정재관(鄭在寬) 등이 주도하였으며, 이상설·이동휘가 각각 정·부통령에 피선되었다. 산하에 편성된 광복군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본군경에 압수당한 독립운동 관계 문서에 의하면, 1914년 당시 이상설 주관하에 있던 시베리아 병력을 제외하고도 만주 길림(吉林)에 26만명, 무송현(撫松縣)에 5,300명, 왕청현(汪淸縣)에 1만 9,507명, 통화(通化)·회인(懷仁)·집안(集安)지역에 39만명, 미국에 855명 등의 한인이 훈련을 받고 무장을 갖추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산하에 편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립 뒤 국외의 모든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과 공동방위체제를 확립한 러시아 정부에 의해, 러시아 내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모든 정치·사회 활동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9월 정부 수립의 모체가 된 권업회가 해산을 당하자 큰 타격을 받아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해체되었다.
4. 대한국민의회(1919.3)

대한국민의회라 함은 1919년 전로한족회중앙총회를 확대하여 러시아에서 건립한 최초의 임시 정부 조직을 말한다. 제1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뒤 러시아 지역의 한인(韓人)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2월 25일부터 연해주 니콜스크-우수리스크(Nikolsk-Ussurysk) 시에서 전로한족회중앙총회가 중심이 되어 러시아와 만주 지역의 한인 민족 운동 지도자들을 소집해 전로국내조선인회의(全露國內朝鮮人會議)를 개최했다. 이 회의의 목표는 제1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국제 정세와 파리 강화 회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회에서는 문창범(文昌範), 김치보(金致寶), 김하석(金河錫), 장기영(張基永), 김진(金震) 등 5인의 발기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조직된 체코슬로바키아의 국민 의회를 모델로 대한 국민 의회를 조직하기로 의결했다.
대한 국민 의회는 전로한족회중앙총회를 확대⋅개편하는 형식으로 조직되었다. 하지만 종래의 전로한족회중앙총회가 러시아 지역 한인 사회의 대표 기관이었던 것에 비하여, 만주와 국내의 대표들을 소집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전체 한인을 대표하는 임시 중앙 기관으로 자임했다.
국민 의회는 소비에트제를 채택하여 입법과 사법, 행정 세 기능을 모두 갖고 있었고, 상설의회가 중요 결정을 떠맡도록 했다. 러시아 각지의 한족회가 국민 의회 지방 조직을 담당했고, 서⋅북간도와 국내에도 지부를 결성했다. 국민 의회 의장에는 문창범, 부의장에 김철훈(金哲勳), 서기에 오창환(吳昌煥)이 선출되었다. 외교부장에는 최재형(崔在亨), 선전부장에는 이동휘(李東輝), 재정부장에는 한명세(韓明世)가 선임되었는데, 이 중 선전부는 독립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부서였다. 상설의회 의원은 30명을 두었으며, 여기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 5명, 서울⋅경기 출신 5명이 포함되었다. 이는 국민 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회의에서는 국민 의회를 결성한 뒤 3단계 독립운동 방략을 수립했다. 1단계는 독립선언서 발표 및 평화적 시위운동 단계, 2단계는 한인 무장 세력에 의한 국내 진입의 무력 시위운동 단계, 3단계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의 외교 활동 단계였다. 이들은 한인 무장 세력을 결집해 일본군과 전쟁을 벌여 서구 열강으로부터 교전 단체로 승인받고, 한국의 독립 문제를 파리 강화 회의의 의제로 상정시키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 의회는 1919년 3월 17일 대한 국민 의회 명의의 독립선언서를 내외에 발표함으로써 그 성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는 국내외를 통해 임시 정부 성격을 띤 최초의 조직이었다. 선언서를 발표한 뒤 국민 의회는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평화적 시위를 이끌었다. 또한 청년 무장 세력을 국내로 진입시킬 계획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국민 의회에 이어 상하이와 한성(서울)에도 임시 정부가 결성되어 통합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민 의회는 임시 정부의 위치를 상하이에 두고, 상해 임시 의정원과 대한 국민 의회를 통합해 의회를 조직한다는 상해 임시 정부의 의견에 따라 1919년 8월 30일 해산을 결의했다. 이어 이동휘와 문창범이 통합을 위해 상하이로 갔다. 그러나 국민 의회 측 인사들은 상해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임시헌법을 제정하자 이에 반발했다. 결국 이동휘만 국무총리로 남고 문창범은 초대 교통총장 자리를 사임하며 러시아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동휘 역시 노선 갈등 및 독립운동 자금 관련 논쟁으로 인하여 1921년 초 임시 정부를 탈퇴하고, 상하이 지역에서 고려 공산당을 창당하였다.
국민 의회 측은 1919년 12월 임시 총회를 열어 활동 재개를 모색하고 1920년 2월 14일 국민 의회의 재건을 선언했다. 1920년 4월 일본군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침공함으로써 러시아 혁명에 본격 개입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볼셰비키 혁명정부군뿐만 아니라 한인 독립운동 세력도 철처히 탄압하였다. 일본군에 의해 한인 운동가들이 체포되자 5월 국민 의회는 연해주를 떠나 아무르 주로 이동하여 조직을 재정비했다. 그 뒤 국민 의회는 소비에트 혁명 세력을 지지하며 공산주의 노선을 선언했다. 1921년 간부들은 대부분 이르쿠츠크파 고려 공산당의 일원이 되었다. 이후 이르쿠츠크파와 이동휘 계열의 상해파 고려 공산당은 한인과 그 독립군 조직을 대표하는 공산당으로서 지위를 놓고 대립했다.
'한국사 두문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910년대 북간도 독립군 두문자 : 간 중 의 (0) | 2025.01.12 |
|---|---|
| 1910년대 서간도 독립군 두문자 : 경 부 한 서 (0) | 2025.01.12 |
| 애국계몽운동 두문자 : 보헌자 협신 (0) | 2025.01.11 |
| 한일간 조약 두문자 : 의충협고 을통정차 경총 (0) | 2025.01.11 |
| 1908년 주요 사건 두문자 : 동독 원사스 (0) | 2025.01.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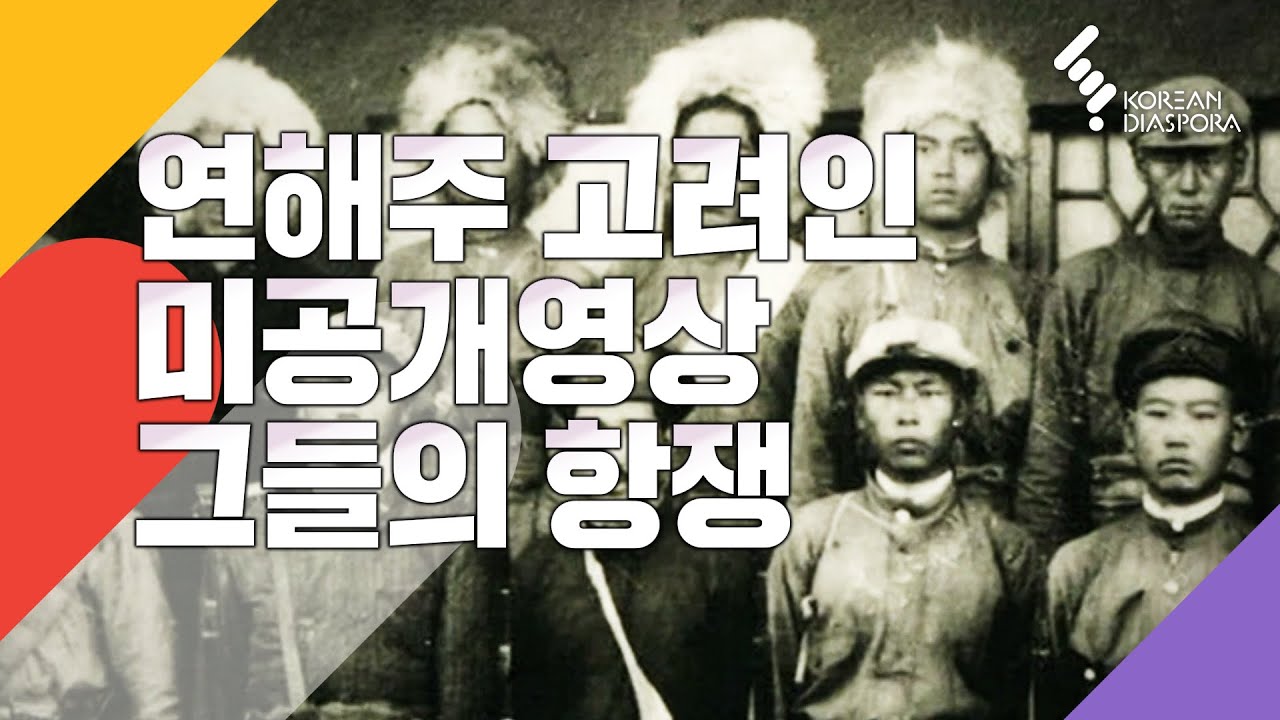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