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다 _ 어원 자료

‘비싸다'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옛날의 뜻과 달라진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전의 뜻풀이를 소개해 두기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물건 값이나 사람 또는 물건을 쓰는데 드는 비용이 보통보다 높다'로 풀이되어 있다. 이의 반대말이 ‘싸다'이니까 ‘싸다'는 당연히 ‘~이 보통보다 낮다'의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비싸다는 ‘비'와 ‘싸다'로 분석될 수 있음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비'의 어원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성싶다. ‘싸다'의 반대말이니까 이 ‘비'를 부정을 나타내는 한자어 ‘비(非)'로 유추하여 연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아무리 한자를 즐겨 쓰는 사람이라도 ‘비싸다'를 ‘非싸다'로 쓴 사람을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설명이 맞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도 그럴것이 이‘비'는 원래 ‘비'가 아니고‘빋'이었기 때문이다.
‘비싸다'는 15세기 문헌에 ‘빋사다'나 ‘빋싸다'로 출현한다. 즉 ‘비싸다는 ‘빋'과 ‘싸다'나 ‘사다'가 합쳐진 복합어인 것이다. 이것들이 ‘빋소다, 빗싸다, 빗씌다, 빗빠다' 등으로 표기를 달리하다가, 20세기에 와서 ‘비싸다'로 굳어진 것이다. 그리고 ‘빋'은 주격조사 ‘-이'와 결합되면서 ‘비디'가 ‘비지'로 구개음화되어 그 어간이 ‘빋'에서 ‘빚'으로 바뀌어 오늘날에는 ‘빚'으로 되었다. 그러나 실제 발음에서는 ‘빗'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빋싸다(빋사다) > 빗씌다(빗싀다) > 빗싸다> 비싸다'의 변화과정을 거친 것이다.
편안호미사 빋소미 하니라(安樂直錢多)<1517번역노걸대, 하, 4a>
참조 cf. 편안홈이아 빗싸미 하니라<1670노걸대언해, 하 4a>
衒賣色안 겨지븨 나찰 빗어 빋사게 하야 팔 씨라<1447석보상절, 21, 61b>
빗싸다(高價)<1880한불자전, 329>
싀를 만니 길드리난 집이 가보니 읭무 한 말이 잇쓰믜 갑슬 무르니 갑시 믜오 빗싸거늘<1885유옥역전>
비싸다 價高<1880한불자전, 328>
비싸다 價高<1895국한회어, 157>
터 놓고 말이지 사실 내겐 비싼 흥정였었소.<1930薔薇병들다 52>
오늘날 ‘빚'은 ‘부채(負債)' 또는 ‘채무(債務)'란 뜻이어서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을 뜻하지만, 15세기에 나타나는 ‘빋'은 그러한 의미 이외에 ‘값'에 해당하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다음에 보이는 예문에서 ‘비디, 비들(즉 오늘날의 ‘빚이, 빚을)'은 ‘값이, 값을'이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비디, 비들'을 각각 ‘값이, 값을'로 바꾸어 해석하여도 문맥상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子賢長者ㅣ지븨 세 分이 나사가셔 겨집 죵알 파라지이다 子賢長者ㅣ듣고 세 分을 뫼셔 드라 겨집죵의 비디 언메잇가 夫人이 니라샤듸 내 몸앳 비디 二千斤ㅅ金이니이다 夫人이 또 니라샤듸 븨욘 아긔 비디 또 二千斤ㅅ金이니이다<1459월인석보, 8, 81a>
‘겨집죵의 비디 언메잇고'는 ‘계집종의 값이 얼마인가'고 묻는 것이지 ‘계집종의 빚이 얼마냐'고 묻는 것이 아니다. ‘빋'이 오늘날의 ‘값'에 해당한다면 15세기 국어에는 ‘값'이란 단어가 었던가? 그렇지 않다. ‘값'은 ‘빋'에 비해 더 많은 빈도를 가지고 사용되었다. 그러나 언뜻 보아 ‘값'과 ‘빋'의 의미차이를 구분하기는 힘들 것이다.
‘값 싸다'도, ‘빋 싸다'도 모두 ‘그 값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값 싸다'나 ‘빋 싸다' 모두 ‘갑시 싸다', ‘비디 싸다'로 쓰이었는데, 다음 문장을 비교하여 보면 그 뜻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값싸다'와 ‘빋싸다'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자.
일훔난 爲頭한 오시 갑시 千萬이 싸며<1459월인석보, 11, 2b>
일훔난 됴한 오시 비디 千萬이 싸며<1447석보상절, 13, 22b>
두 문장 모두 ‘옷의 값이 천만에 해당한다'는 뜻이어서 옷이 매우 귀함을 표시한 문장이다. 그렇다면 ‘값과 ‘빋'의 의미차이는 무엇일까?
‘값'은 한자로는 ‘가(價)'로 ‘빋'은 ‘치(値)'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자어 ‘가치(價値)'의 ‘가(價)'와 ‘치(値)'가 각각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 고유어가 분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가(價)'와 ‘치(値)' 는 어떻게 다를까? ‘가(價)'는 주로 ‘수직(售直)'이나 ‘매(賣)'와 통하였고 ‘치(値)'는 주로 ‘당(當)'에 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가(價)'를 ‘갑 가 數物售直賣逋으로, 그리고 ‘値'를 ‘만날 치 遇也 當也 持也 又物價直通'로 풀이한 류주석(1856)에서도 알 수 있다. ‘수직(售直)'이나 ‘매(賣)'는 ‘팔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서 ‘値'는 주로 ‘당(當)'과 ‘물직(物直)'과 뜻이 통하는데, ‘當은 ‘전당(典當)'의 의미도 갖고 있으며 ‘물직(物直)'은 오늘날의 뜻으로 ‘값싸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直 物價 싸다<1669어록해(개간본), 4a>
이러한 사실로 보아 ‘값'은 주로 ‘팔 때의 값을, 그리고 ‘빋'은 ‘살 때의 값'을 뜻하는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값'과 ‘빋'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값싸다'와 ‘비싸다'는 전혀 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 문제는 ‘싸다'를 설명한 후에 풀이하기로 하자.
‘싸다'는 오늘날에는 ‘값이 헐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의 뜻은 ‘그 값에 해당한다'나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쓰이었다. ‘매를 맞아 싸다' 등에 아직도 그 의미가 남아 있다. 이때의 ‘싸다'는 물건값으로 말하면 ‘고가(高價)'일 때 사용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뵛 갑슨 싸던가 디던가(布價高低麽)<1517번역노걸대, 상, 9a>
이 예문은 문헌상에서 ‘뵈'를 팔 사람이 묻는 것이어서 ‘갑시 싸다'는 ‘고가(高價)'를 뜻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물건을 팔 때에는 ‘값싸다'는 ‘고가(高價)'를, ‘값디다'는 ‘저가(低價)'를 의미하였다. 이에 반해 ‘빋싸다'는 물건을 사는 쪽에서 평가하는 내용이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파는 사람은 자신의 물건값을 ‘싸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상대방의 물건값을 ‘비싸다'고 하지, 사는 사람이 ‘싸다'고 하며 물건을 사거나, 파는 사람이 ‘비싸다'고 하며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값싸다'가 ‘낮은 값'을 뜻하는 말로 변화하였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값싸다'는 파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서는 ‘값이 높다'는 뜻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값이 헐하다'고 표현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값이 적당한 것은 파는 사람에게는 ‘고가'이지만, 사는 사람에게는 ‘저가'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값싸다'는 값이 헐하다는 뜻으로 변화하고, ‘빋싸다'는 원래 그 뜻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싸다'가 ‘그 값에 해당한다' 또는 ‘값이 있다'는 뜻에서 ‘값이 헐하다'란 뜻으로 의미변화를 일으키게 된 시기는 19세기이다.
싸다(價歇)<1895국한회어, 173>
그 이후 오늘날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비싸다'는 ‘빋 + 싸다'가 변화한 것인데, ‘값싸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표현의 주체가 바뀌면서 의미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사다'와 ‘팔다'가 어느 언형에서는 각각 반대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해석된다.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에 고 서영춘 씨의 노래 <기차놀이>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제목은 가물가물하지만 가사는 잘 기억한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면 뭔가 이상한 내용이 있었다.
“시골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에, 차표 파는 아가씨와 승강이하네, 이 세상에 메누리 없는 장사 어딨어?”
하는 부분이었다. 물론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친구 따라 부르기는 했지만
“세상에 며느리 없는 장사”
가 왜 없겠는가? 총각이 장사할 수도 있고, 결혼을 했어도 아들이 장가를 안 갔으면 며느리가 없을 텐데, 어쩌자고 저런 말이 다 나왔을까 하고 혼자 고민했던 적이 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메누리’가 아니고 ‘에누리’였다는 것을 알았다. 물건을 팔 때 이미 깎아 줄 요량으로 더 불러 놓고 조금 깎아주면서 생색을 낸다는 말이다.
지금이야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를 권장하지만 과거에는 돈 있으면 자가용 타고, 과시하기를 좋아했다. 비싼 것이면 무엇이든 다 좋다는 의식을 갖고 살았다. 또한 외제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다. 현대인은 참으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이제는 한국산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세계 사람들이 다 안다. 가격도 싸고 물건의 질도 좋다. 비싼 외국의 유명 제품과 비교해서 뒤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비싸다’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원래 ‘비싸다’는 말은 ‘상품 값이 너무 높다’는 뜻이 아니었다.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얼마 동안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15세기 문헌에는 ‘빋ᄉᆞ다’로 나오고, 16세기 문헌에는 ‘빋ᄊᆞ다’로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빋ᄉᆞ다’에서 유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빋ᄉᆞ다’는 ‘빋’과 ‘ᄉᆞ다’가 결합된 어형이다. ‘빋’의 의미는 값(價)과 빚(債)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주로 ‘값’의 뜻으로 쓰였다. 예를 들면 ‘빋디다’는 ‘값싸다’의 뜻으로, ‘빋디우다’는 ‘값을 낮추다’의 의미였으니 일반적으로 ‘빋’이라 하면 주로 ‘값’을 뜻하였다. 그러던 것이 근대에 접어들면서 ‘값’의 의미가 남아 있는 것은 ‘비싸다’에만 남아 있고, 대부분의 경우 ‘빚’으로 바뀌어 채무의 뜻만 강하게 남아 있다.(이상 조항범의 <우리말 어원이야기>에서 요약 정리함)
‘비싸다’의 원래의 의미는 “그만한 가격이 있다”는 의미였다. ‘싸다’라는 말은 현대어에서는 ‘적당하다, 그럴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그 놈은 맞아도 싸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비싸다’의 의미는 ‘그 물건의 질에 비해 가격이 적당하다’라는 뜻이었는데, 현대어에 오면서 ‘가격이 높다’로 바뀌게 되었다. 지금은 완전히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뜻으로 굳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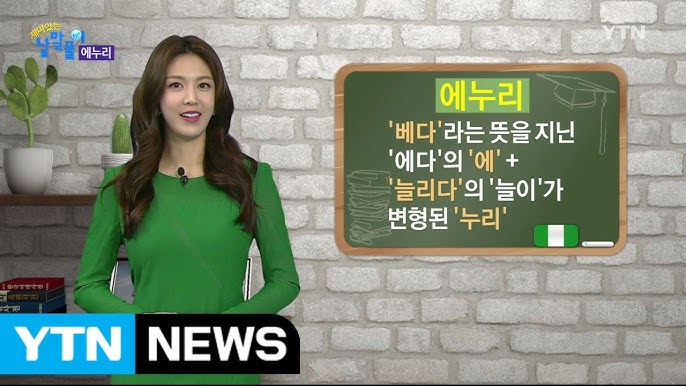
다음으로 “세상에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냐?”는 말이다. 내용상으로 볼 때 물건을 팔 때 깎아주는 일을 일컫는 것처럼 들린다. “세상에 깎아주지 않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알아듣는 사람이 많다. 사실 ‘에누리’라는 단어는 ‘물건을 팔 때 받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는 것’을 뜻한다. 고객이 깎을 줄 미리 알고 그만큼 가격을 보태서 말하는 것이 ‘에누리’다. 미리 깎을 것에 대비해서 많이 붙이는 것이 현대에 와서는 ‘어떤 말을 더 보태거나 축소시켜 이야기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사전) ‘에누리’의 옛말은 ‘에히다(어히다)’에서 비롯되었다. ‘어히다’는 ‘베어내다(割), 잘라내다’의 뜻이다. ‘어히다>어이다’로 변했다가 다시 ‘에다>에이다’로 변했다. ‘에+ 누리(덩어리) = 에누리(잘라낼 것을 알고 미리 떼어낸 덩어리?)’로 완성되었다. 고객이 잘라낼 것을 미리 알고 덧붙여 부르는 가격이다. 가격을 덧붙인 줄 알고 있으니 조금만 깎아달라고 흥정하는 중에 나오는 말이 ‘에누리 없는 장사 없다’로 정착한 것이다. 요즘은 QR코드로 읽고 흥정할 기회도 없이 카드에서 돈이 빠져 나간다. 이제는 ‘에누리’라는 말도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지깽이 _ 어원 자료 (0) | 2025.02.04 |
|---|---|
| 부채 _ 어원 자료 (0) | 2025.02.04 |
| 뽀뽀 _ 어원 자료 (0) | 2025.02.04 |
| 뽐내다 _ 어원 자료 (0) | 2025.01.31 |
| 사나이 _ 어원 자료 (0) | 2025.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