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바꼭질 _ 어원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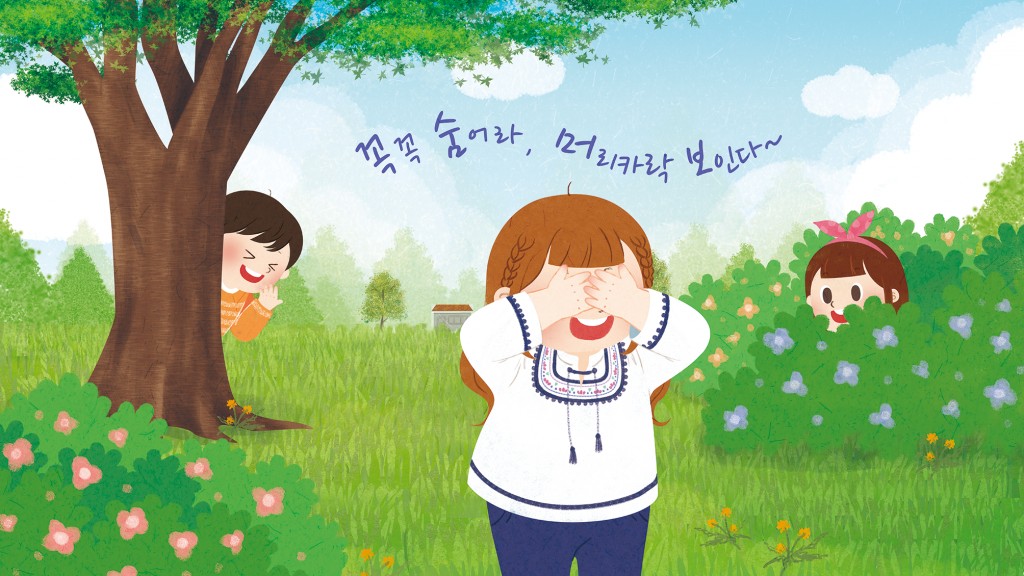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며 손가락을 높이 치켜들어 놀이 동참자를 부르면 여러 아이들이 그 손가락을 붙드는 것으로 숨바꼭질은 시작된다. 그렇게 참가자가 모이면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만들고, 술래가 두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대문 등의 기둥에 머리를 박은 뒤에,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 번을 센다. 그래서 빨리 세느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하나 둘 세 네 다서 여서 일고 여덜 아호 별'이 된다. 이것이 후에는 음절수가 10인 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바뀌었다. 그동안 옆에서 보는 아이들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술래가 숨은 사람을 찾고 머리를 대고 있던 곳을 손으로 탁 치면서 ‘만세!(일제 강점기 때에는 뜻도 모르던 ‘야도!'였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 술래에게 들킨 아이가 다시 술래가 된다.이것이 우리가 어려서 놀던 ‘숨비꼭질' 놀이의 과정이었다.
이 놀이가 숨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숨바꼭질'의 ‘숨은 ‘숨다의 어간 ‘숨'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바꼭을 ‘박꽉의 변한 말로 알아서, ‘박'은 ‘박다'의 어간 ‘박-'이기 때문에, ‘숨박'은 ‘숨어 박혀 있다'의 뜻이 라거나, ‘곡은 ‘곳處'의 변한 말이거나 ‘꼭꼭 숨어라'의 ‘꼭'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도 있다. 어떤 사람은 ‘숨바꼭질'은 ‘순바꿈질'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은 ‘순(巡)을 바꾸어 나가는 놀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순라(옛날에 순라군이 구역 안을 순찰하는 것)를 바꾸어 나가는 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은 ‘숨바꼭질'의 초기 형태가 ‘숨막질'이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그 주장의 근거를 잃게 된다. ‘숨바꼭질'이 출현하기 이전의 초기 형태는 ‘숨막질'이었다. 16세기에 처음 등장해서 간혹 19세기까지도 나타나기도 한다.
녀름내 숨막질하나니(一夏裏藏藏昧昧)<1517번역박통사, 상, 18b>
숨막질(迷藏)<18xx일사문고본 물명고>
그런데 16세기의 초간본에 보이던 ‘숨막질'이 17세기의 중간본에는 ‘수뭇져기'로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숨 + 웃져기'로 분석될 것 같지만 아직은 해독이 어려운 어형이다.
한 녀름은 수뭇져기 하나니라 <1677박통사언해, 상, 17b>
그리고 17세기에 와서는 ‘숨박질'로 나타난다. 이 ‘숨박질'은 19세기끼지도 사용되었다.
숨박질(迷藏)<1657어록해, 9a>
숨박질(迷藏)<18xx物譜>
숨박질(迷藏) <18Xx다산물명고>
숨박질(迷藏)<18Xx진동혁 교수소장본 물명고>
숨박질(迷藏)<18Xx재물보>
숨박질(迷藏)<18Xx만송문고본 물명고>
숨박질 <1895국한회어, 191>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 ‘숨박금질', ‘숨박곡질', ‘슘박꿈질' 등으로 출현 한다.
숨박금질 <18Xx물명괄>
숨박금질(迷藏) <18xx진동혁 소장 물명류>
숨박곡질(迷藏) <18xx광채물보, 물성, 1a>
슘박꿈질하다(匿戲) <1880한불자전, 441>
따라서 ‘숨비꼭질'은 ‘숨막질'에서 출발히며 ‘수뭇져기'를 거쳐 다시 ‘숨박질, 숨박금질(슘박꿈질), 숨박곡질' 등의 세 가지 어형을 거쳐, 19세기에는 모두 다섯 가지 형태가 등장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숨막질'과 ‘수뭇져 기'와 ‘숨박질'과 ‘숨박꿈질'과 ‘숨바꼭질'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들은 각각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말일까?
우선 ‘숨막잘을 보자. ‘숨막질' 등의 '질'이야 되풀이되는 동작이다 동을 나타내는 접미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숨막은 무엇일卯 ‘숨막의 ‘숨 은 과연 ‘숨다의 어간 ‘숨'일万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원래 ‘숨막질'이 ‘자맥잘을 뜻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즉 물속을 들어갔다 니웠다 하는 행동이 ‘숨막질'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숨막잘과 동일한 의미인 ‘숨박질'의 한자퓰이에서 알 수 있다.
숨박딜(潛) <18xx유희 물명고>
‘숨박질'은 ‘잠(潛)', 곧 물속으로 자맥질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 마찬 가지로 ‘숨박금질(숨박꿈질 등)'도 원래는 ‘자맥질'을 뜻하였다. ‘숨박꿈질'은 ‘숨 + 박꾸- + -ㅁ + -질'로 분석되는데, ‘박꾸-'는 ‘바꾸다의 뜻이며, 그래서 ‘숨'은 역시 ‘숨다'의 어간이 아니라 ‘숨쉬다'의 ‘숨'이다. 그래서 ‘숨바꼭질'은 그 의미가 ‘숨쉬는 것을 비꾸는 일'을 의미한다. 현대 국어에서도 헤엄 칠 때에 숨을 바꾸어 쉬고 물속으로 숨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표준국어 대사전」의 ‘숨바꼭질'의 뜻풀이에 "헤엄칠 때에 물속으로 숨는 짓"이 등재 되어 있는 이유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며, 또한 방언형인 ‘숨바꼭질군'이 ‘잠수부'를 의미하는 단어로 남아 았는 것도 그러한 증거다. 그래서 ‘숨바꼭질'은 원래는 물속에서 ‘술래찾기'를 하는 어린이 유희로서 존재했었는데, 이것이 지상에서는 오늘날의 ‘숨바꼭질'의 유희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물숨박꼭질[潛]'(18xx광재물보, 地道, 4b)과 같은 용례까지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숨막질'의 ‘막'과 ‘숨박질'의 ‘박'은 무엇이며, ‘숨바꿈질'이 왜 ‘숨바꼭질'에서처럼 ‘꿈 이 ‘꼭'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숨막'의 ‘막'은 ‘막다'의 어간인 ‘막-'이 아니다. ‘숨막질'의 ‘숨막'을 ‘숨(을) 막다'에 해당하는 ‘숨막'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접미사 ‘-질'은 그 앞에 ‘가위질, 계집질, 낚시질, 뒷걸음질' 처럼 명사가 올 뿐, 동사의 어간은 통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숨질 > 숨막질 > 숨박질'에서 찾을 수 있다. ‘숨질'이란 조어법이 가능해서 ‘한숨질(졍신이 아득 한숨질 눈물 졔워 경경오열하야<춘향전>)'과 같은 표현이 기눙한데, 이러한 ‘숨질'에 ‘-막-'과 ‘-박-'이 통합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사와 '-질' 사이에 ‘-막 이나 ‘-박'의 형태가 들어가는 예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뜀질'에 대해 ‘뜀박질'이 있으며, ‘다름질(‘닫다'의 명사형 ‘다름 + -질')'에 대해 ‘다름박질'이 있으며 또한 ‘드레질'에 대해 ‘드레박질'이 있다. 그리고 ‘근두질, 근두막질, 근두박질' 등의 용례는 흔한 예이다.
근두질하다<1690역어유해, 하, 24a>
군두막질(翻金)<18xx일사문고본 물명고>
근두박질(翻金)<18xx다산물명고>
근두박질(筋斗)<18xx광재물보, 물성, 1a>
이와 같은 ‘막과 ‘박'의 ㄱ에 유추되어 ‘숨박굼질'이 ‘숨바꼭질'로 변화한 것이다. 16세기에 ‘숨막질'이, 그리고 17세기에는 ‘숨박질'이 등장하여 쓰이다가 19세기에 와서 이들을 대치하는 ‘숨박굼질'이 나타났는데, 특히 이 ‘숨박굼질'은 ‘숨바꿈질'의 의미였다. 수중에서의 어린이들 놀이가 육지에서의 놀이로 바뀌면서 오늘날의 의미로 변화한 것이다. 오늘날 아파트 숲에서 ‘숨바꼭질' 놀이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어린이들에게 ‘숨바꼭질'은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여지도 없어진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숨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숨이 있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숨을 쉰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숨을 멈추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여 숨을 거두었다거나 끊어졌다고도 합니다만 아무튼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나타낼 때 목숨이라고 합니다. 주로 숨은 목에 걸려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목을 막으면 숨을 더 이상 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숨을 죽인다고 하면 오히려 죽었다는 뜻이 아닌 것은 흥미롭습니다. 숨죽이고 가는 것은 들키지 않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숨은 활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활력이 사라진 것은 숨이 죽었다고 합니다. 주로 나물이나 나무가 시들었을 때 숨이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숨이 인간을 살리기도 하는 것은 한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있어도 한숨을 쉬고, 안심할 때도 한숨을 쉽니다. 이런 한숨은 안도의 한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크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물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한숨은 내 답답한 가슴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앞두고 긴장이 되면 크게 숨을 쉬고 일을 시작합니다. 숨은 그런 의미에서 수행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명상이나 수련 등을 보면 늘 호흡법이 중요합니다. 깊게 호흡하는 것이, 단전으로 호흡하는 것이 수련의 시작입니다.
숨은 뜻밖의 단어로 이어져 나갑니다. 앞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을 죽인다고 표현하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숨다입니다. 숨는 것은 숨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을 참는 것입니다. 숨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다와 관련된 숨기다 역시 숨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숨고 숨기는 것은 긴장되는 일입니다. 긴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숨이 멎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게 추론이 가능한 것은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숨바꼭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만, 옛말에서는 숨박질이라고 하였고, 이 말은 자맥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맥질의 기본은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입니다. 숨 쉬지 않는 모습을 자맥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박질의 옛말에는 숨막질은 숨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바꼭질의 기본은 숨어서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술래가 가까이 오는 긴장된 순간에 숨을 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숨을 참아야 하는 겁니다. 숨바꼭질에는 아이들이 놀면서 물속에 숨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숨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는 바로 쉬다입니다. 숨을 쉰다고 하는데 쉬다라는 말 역시 어원적으로는 숨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동사의 어간이 어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보면서 숨을 잘 쉬는 것은 어쩌면 잘 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을 쉬다는 말과 휴식을 취한다는 말은 같은 어원으로 보입니다. 잘 쉬어야 숨을 잘 쉴 수 있기 때문이고, 숨을 편히 쉬는 것이 휴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 차오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벅차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고,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가슴을 치기도 하고, 가슴을 쥐어뜯기도 합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겁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숨을 가다듬고, 좀 쉬어야 합니다. 한숨 돌리고, 좀 쉬고 나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겁니다.
그늘에 앉아서 잠깐 쉴 때, 어릴 적 숨바꼭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입가에 웃음이 지어질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꼭꼭 숨어있었더니 술래가 찾는 걸 포기하고 집에 가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참 동안 숨어있었네요.
숨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10개의 근육이 숨을 들이마실 때 사용되고, 8개의 근육이 숨을 내쉴 때 사용된다. 일정 시간 내에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은 죽게 된다. 따라서 숨을 쉰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고 숨이 멈추었다고 하는 건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을 뜻하는 말로 ‘숨이 멈췄다’거나 ‘숨이 끊어졌다’고 한다. 사람의 생명을 나타낼 때 목숨이라고 하는데 주로 숨은 목에 걸려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숨을 죽였다고 하면 이때는 들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배추나 나물 등에서 숨이 죽었다고 할 때는 시들었을 때를 의미하는데 김장할 때는 소금물로 숨을 죽여야 한다. 몹시 긴장하거나 긴장이 풀릴 때는 한숨을 쉬기도 하는데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명상이나 수련 또는 참선할 때 가장 먼저 익히는 연습이 호흡법이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여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반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호흡할 때 배가 아닌 단전으로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을 죽인다고 표현하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숨다이다. 숨는 것은 숨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을 참는 것이다. 무사가 싸움할 때 상대에게 숨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멈추는 것은 가장 기본이다. 숨을 쉬다라는 말 역시 어원적으로는 숨과 관련이 있다. 숨을 쉬다는 말과 휴식을 취한다는 말은 같은 어원으로 사용된다. 숨차다고 하는 말은 운동 등으로 숨쉬기가 힘들다는 뜻도 있지만 일이 벅차다는 생각이 들 때도 사용한다.
숨바꼭질은 한 사람이 술래가 되어 나머지 사람들이 몸을 숨기면, 술래가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놀이를 말한다. 숨바꼭질은 숨막질의 변형이라는 설이 하나이고, 숨박곡질의 변형이라고 보는 의견이 또 다른 하나이다. 숨막질이 기원이라는 설은 숨바꼭질이 본디 숨을 막은 채 물속에서 즐기던 놀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숨박곡질이 기원이라는 설은, 숨바꼭질이 숨어 박혀있다는 뜻의 숨박에, 곡은 장소를 뜻하는 곳의 변형, 질은 되풀이되는 동작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접미사로 구성된 단어라고 설명한다. 즉 숨고 박혀있는 놀이라는 뜻이다.
술래잡기라 함은, 여러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숨은 아이를 찾아내는 어린이놀이를 말한다. ‘숨바꼭질’ 또는 ‘술래놀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경비를 위해서 순찰을 돌던 이를 ‘순라(巡羅)’라고 하였는데, 술래라는 말은 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이도 있다.
이 놀이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러 아이들은 한 줄로 늘어선 다음 ‘차례세기’로서 마지막에 남은 아이를 술래로 정하거나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일 많이 진 아이를 술래로 삼는다. 술래는 전봇대나 큰 바위 같은 데(이를 술래의 집이라고 한다.)에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서거나 엎드린 채 큰 소리로 “하나·둘·셋……”하고 서른이나 쉰까지 세어나간다.
이때 아이들은 제각기 적당한 곳을 찾아 몸을 숨기며 술래는 숨는 아이들에게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숫자를 빠르게 주워섬긴다. 수를 다 세고 난 뒤에는 술래가 아이들을 찾아 나서며, 숨은 아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어디에 숨은 누구 찾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수를 세던 자리에 돌아와서 집을 손이나 발로 가볍게 친다.
한편, 여기저기 숨어 있던 아이들은 술래가 떨어져 있는 사이에 재빨리 뛰어나와서 역시 술래의 집을 손이나 발로 친다. 술래가 한 아이밖에 찾지 못했으면 이번에는 그 아이가 술래가 되며 여럿인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한다.
곳에 따라서는 술래가 숨은 아이를 찾은 경우라도 뛰어가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어야 죽은 것으로 치며, 만약 그 아이가 술래의 집에 먼저 도착하면 그대로 사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술래는 숨은 아이를 차례대로 다 찾아내어야 하며, 술래에게 잡히거나 뛰어나와서 살아난 아이들은 아직도 숨어 있는 아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응원한다.
“꼭꼭 숨어라/머리카락 보인다/꼭꼭 숨어라/범 장군 나간다. ……”. 또 한가지 방법은 집을 정한 뒤에 술래가 한 아이의 무릎에 엎드리면 그 아이가 술래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역시 “하나·둘·셋……” 하고 약속한 수까지 세는 방법이다. 이때 그 아이는 이어서 “바루 뗑 인경 뗑/삼경 전에 고구마 떴다/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소리를 질러서 술래가 아이들을 찾아 나서는 것을 알려준다. 곳에 따라서는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는 방법을 써서 놀이 자체에 변화를 주기도 하며, 살아난 아이를 헤아려서 점수로 매겼다가 일정 수에 도달하였을 때 한판이 끝난 것으로 삼기도 한다.
'우리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설빔 _ 어원 자료 (0) | 2025.01.30 |
|---|---|
| 소나기 _ 어원 자료 (0) | 2025.01.30 |
| 숫되다 _ 어원 자료 (0) | 2025.01.30 |
| 잠 _ 다양한 표현 자료 (0) | 2025.01.30 |
| 애꿎다 _ 어원 자료 (0) | 2025.01.30 |




댓글